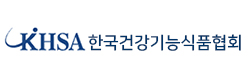다이어트 위해 혈당측정기 차는 MZ들,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Continuous Glucose Monitor)를 다이어트 도구로 활용하는 트렌드가 확산 중이다.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된 이 기기는 이제 ‘헬스 인플루언서 필수템’으로 떠오르며, 식사 직후의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음식 반응을 기록하는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GM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당뇨인이 혈당을 1~2회 측정해 수치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혈당 스파이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하면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혈당이 낮을수록 건강하다’는 단순화된 인식에서 왔다. 혈당은 운동, 스트레스, 수면, 생리주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동하며, 그 자체가 ‘위험, 나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CGM 사용자들은 “사과 한 조각에도 혈당이 올라서 무서워졌다”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끊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CGM 기기의 센서 교체 주기는 통상 1014일, 월 평균 유지비만 20만30만 원에 달한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우려는 데이터 해석의 오류다. CGM은 초단위로 혈당을 측정해 데이터를 쌓지만,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의료 전문가에게 있다.
비전문가가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습관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신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가 CGM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실시간 피드백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자기 관리는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세대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이를 두고 기기의 원래 용도와 과학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