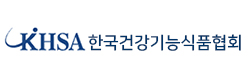박가영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문일답
박가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1월 17일은 ‘세계 이른둥이의 날’입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이른둥이들을 돌보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환 중 하나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말 그대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폐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이른둥이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원인은 폐포를 부풀려 주는 폐표면활성제(서팩턴트) 부족입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마치 딱딱하고 질긴 풍선을 아무리 불어도 잘 펴지지 않는 것처럼 아기의 폐가 쉽게 확장되지 못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둥이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신 28주 미만의 아기에서는 60~80%, 임신 32~36주에서는 15~30%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삭아에서도 약 1%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산모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기에게 유전자 이상·흉부 기형 등이 있을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은 대부분 출생 직후부터 나타납니다.
▲빠른 호흡(분당 70회 이상) ▲갈비뼈 사이가 쑥 들어가는 ‘함몰 호흡’ ▲숨쉴 때 끙끙거리는 소리 ▲입술·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등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료진은 즉시 흉부 X-ray·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호흡곤란증후군은 시간에 따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초기에 판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부족한 폐표면활성제를 인공적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으로 약물을 직접 넣어 폐포가 안정적으로 펴지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가능한 한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관 삽관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 공급 ▲기계호흡 보조 ▲체온 유지 ▲수액 조절 ▲감염 예방 등 전신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기의 작은 체온 변화나 감염 위험도 치료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조산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분만 전 산모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여 아기의 폐 성숙을 돕습니다.
이 치료는 호흡곤란증후군 발생률뿐 아니라 미숙아의 생존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이른둥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산모와 신생아 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에서 분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가 숨쉬기 힘들어한다면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가 충분히 성장되기 전에 세상에 나온 아기’에게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다면 많은 아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의 작은 호흡 하나하나가 생명을 향한 신호이기에, 의료진과 가족, 사회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