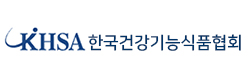최병윤 분당서울대 이비인후과 교수, ‘경증 중이염’ 방치의 대가
왜 언어·학습 지연으로 되돌아오는가

아이들의 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은 흔하게 찾아오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부모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조용한 중이염’이 경도 난청을 만들고, 그대로 방치하면 언어·학습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왜 삼출성 중이염이 잘 생길까?
귀 속에는 코·목과 귀를 잇는 ‘이관(Eustachian tube)’이 있습니다. 이관은 중이의 압력을 맞추고, 고막 뒤에 고인 분비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소아의 이관은 짧고 수평에 가깝고, 기능도 미성숙합니다.
영상·해부 연구에 따르면 이관의 성숙은 만 7~8세가 되어야 절반 이상 진행되며, 사춘기 초기에야 비로소 성인형에 도달합니다. 이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고막 뒤에 물·점액이 고이는 상태, 급성 염증과 통증은 없음)은 소아에서 흔합니다.
실제로 만 4세까지 아이의 최대 80%가 한 번 이상 겪으며, 특히 2~4세에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은 수개월 내 호전되지만 약 25%는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재발률도 30~40%로 적지 않습니다.
‘아픈 기색이 없어서’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경도 난청
삼출성 중이염의 가장 큰 함정은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열도 없고, 아이가 귀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으니 부모·교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막 뒤에 액체가 차면 소리가 막혀 평균 15~35dB 정도의 경도 전음성 난청이 생깁니다. 아이는 TV 볼륨을 크게 틀거나,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느리고, 말귀를 놓치지만 성격 탓이나 산만함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진찰에서는 평탄(Flat) 양상의 고막운동검사(고실도)와 청력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삼출성 중이염은 관찰만으로도 호전되지만, 경도 난청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언어·학습 회로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근거에 따른 경도 난청이 아이의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예전에는 “삼출성 중이염이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연구들은 ‘경도’라 해도 청력 저하가 지속되면 언어·학습·행동에 불리하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업·행동 문제: 인구 기반 코호트(4,779명)에서 경미한 청력 역치 상승(경도 난청)은 학업 성취도 저하와 행동 문제 점수 증가와 연관되었습니다. 2024년 추적 분석에서도 약한~경도 수준의 청력 저하만으로도 학업 성과가 낮고 행동 문제가 많다는 결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JAMA, 2019).
▲언어 발달 지연: 전향 코호트에서는 경도~중등도 난청 아동이 또래보다 언어 수준이 낮고, 보청기 등 청력 보조를 일찍·꾸준히 할수록 언어 성장률이 빨라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Ear Hear, 2016).
▲문장 인지·듣기 환경 취약성: ‘Not-So-Slight’라는 제목 그대로, 약한 청력 손실 아동도 소음·잔향 환경에서 문장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실·학원처럼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체감 손실은 더 커집니다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024).
▲변동성 난청: 삼출성 중이염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변동성 난청’을 일으킵니다. 이런 불안정한 청각 입력은 음소 변별, 단어 저장·작업 기억, 학습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래 지속되면 조음 습득에도 흔들림을 줍니다 (Int Arch Otorhinolaryngol, 2020).
※ 다만 2000년대 초 메타분석 일부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측정 시점과 교란 변수(사회경제적 환경 등) 보정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후의 대규모 연구들은 ‘경도라도 지속되면 위험 신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체크리스트
-TV·태블릿 볼륨을 예전보다 더 크게 틀어 놓는다.
-이름을 불러도 두세 번 지나서야 반응한다.
-소음 많은 곳(교실·식당)에서 대화 이해가 어렵다.
-발음이 뭉개지거나 단어 따라 말하기를 힘들어한다.
-선생님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고실도·청력검사를 권합니다. 부모의 걱정만으로도 검사를 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언제 ‘그냥 지켜보기’를 넘어서야 할까?
국제 진료지침(AAO-HNS, AAP 등)은 대부분의 삼출성 중이염에서 3개월 정도 관찰(Watchful waiting)을 우선 권고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입을 서둘러 고려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양측 삼출성 중이염 + 유의미한 청력 저하
-언어·학습 지연 위험이 높은 아이(언어 지연,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다운증후군, 구개열 등)
-반복 재발로 1년 중 상당 기간을 ‘귀에 물이 찬 상태’로 보내는 경우
개입 방법에는 환기관 삽입, 아데노이드 절제(필요 시), 보청기·FM 시스템·교실 좌석 조정 등이 있습니다. 선택은 청력 저하 정도·지속 기간, 아이의 언어 환경, 학교 적응도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집에서 실천하는 ‘언어·학습 보호’ 5가지
-소음 다이어트: TV·환풍기·에어컨 등 배경소음을 줄이고 아이를 보며 또박또박 말하기
-한 번에 한 메시지: 긴 문장보다 짧고 분명하게, 핵심어는 반복
-어휘 확장 놀이: 그림책 읽기, 따라 말하기·지시 따르기 게임 하루 10분
-학교와 공조: 담임·보건교사와 소통해 교실 앞자리 배정, 과제 지시 반복 확인
-정기 점검: 감기·비염이 잦은 계절에는 청력·고실검사를 통해 변동성 난청 기간 최소화
아이의 귀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만 7~8세 전까지 삼출성 중이염은 흔하고, 조용한 경도 난청으로 오래 이어지면 언어·학습의 토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입하는 것이 나중의 언어·학습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