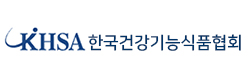[통합돌봄 기획특집 4편] 돌봄의 미래, 기술로 잇다
영국·덴마크 사례로 본 한국형 돌봄의 길…“병원에서 집으로, 그리고 데이터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각국은 ‘병원 중심’에서 ‘집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국이 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이미 앞서간 해외 모델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핵심은 디지털로 상태를 살피고, 지역이 한데 묶어 돕는 구조다.
영국, 디지털 기술로 홈케어 혁신
영국의 통합돌봄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체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구조로, 최근엔 ‘홈케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병원 대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격 건강 모니터링·헬스케어 앱·웨어러블 기기·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기술기반돌봄(TEC, Technology Enabled Care)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LaingBuisson에 따르면 2024년 영국의 노인 거주형 돌봄서비스 시장은 약 262억 파운드(약 46조 원)로, 2021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다.
‘웨스트 미드랜즈 5G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 사례다. 지방정부와 민간 기술기업이 협력해 50종 이상의 디지털 장비로 맞춤형 TEC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350명 이상이 원격 돌봄과 건강 모니터링을 이용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응급실 방문 감소, 재입원율 하락, 사회복지사 업무 효율 향상 등 구체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코트라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돌봄 시장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헬스케어 플랫폼, 모니터링 기기, 디지털 돌봄 솔루션 등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덴마크,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국가’ 모델
덴마크는 흔히 ‘돌봄국가’로 불린다. 국가가 돌봄의 구성·제공·재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소득이나 가족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해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재가 돌봄(Home Help)이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덴마크의 장기요양 예산은 다른 노르딕 국가보다 재가 돌봄에 더 많이 배정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11%)이 재가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센서 기반 낙상 감지 시스템, 스마트 약 복용기, 원격진료(telemedicine) 플랫폼 등 디지털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이 돌봄 서비스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령자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도구로 이 기술들을 적극 도입 중이다.
덴마크 정부가 추진하는 ‘Innovating Health and Assistive Care’ 전략 역시 이러한 기술을 공공 돌봄 체계에 통합해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 돌봄노동자는 대부분 지방정부에 소속된 여성 전문 인력으로, ‘SOSU 헬퍼(사회적 돌봄·건강 도우미)’와 ‘SOSU 어시스턴트(의료보조 요원)’로 구분된다.
정부가 직접 교육·훈련·임금체계를 관리하며, 돌봄이 공공 일자리로 인식되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최근에는 행정업무 증가, 급여 정체,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인력 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식 돌봄의 대상이 가장 허약한 노인들로 좁혀지면서, 비공식 돌봄(가족·이웃 등)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덴마크의 사례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면서도,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인력 관리의 균형이 지속가능한 돌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 “디지털+공공성”의 결합 필요
한국은 내년부터 통합돌봄법이 전국 시행되며, ‘병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돌봄 전환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려면 해외 사례처럼 기술과 공공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처럼 데이터 기반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덴마크처럼 공공 인력 양성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한국형 모델의 현실적 해법”이라고 말한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의 결합은 통합돌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치료제, 원격 모니터링이 도입되면 돌봄의 연속성이 강화되고, 의료비 절감과 환자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돌봄·의료·디지털 헬스가 결합된 ‘데이터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통합돌봄센터, 보건소, 민간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어디서나 이어지는 돌봄’이 현실화된다.
“병원에서 집으로, 그리고 데이터로.”
이제 돌봄은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갈 뿐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 -국제사회보장리뷰 "덴마크 공식 돌봄 및 비공식 돌봄 변화(Changes in Formal and Informal Care Giving in Denmark)" 티네 로스트고르(스톡홀름대 교수) Tine Rostgaard(Stockholm University)
-의학신문: 영국 홈케어 수요 확대,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주목하라
-Innovating health and assistive care in Denmark(덴마크의 보건 및 돌봄 혁신, https://healthcaredenmark.dk/media/rs2cuuiu/innovatingcare_web.pdf)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