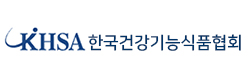병원은 클수록 좋다? 내 몸에 맞는 ‘병원 체급’이 있다
1·2·3차 의료기관, 내 증상에 맞는 길은 따로 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어디 병원에 가야 하나”다.
집 근처 의원을 갈지, 아니면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대형 대학병원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규모가 클수록 더 정확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대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증상의 경중과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치료의 효율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단계화돼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대기와 비용을 줄이고, 보다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일상 질환과 만성질환의 출발점, 1차 의료기관
의원과 보건소로 대표되는 1차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최전선이다.
감기, 장염 같은 급성 경증 질환부터 고혈압·당뇨병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까지, 대부분의 일상적 건강 문제는 이 단계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
병상 수는 적지만, 1차 의료기관의 강점은 환자의 생활 습관과 과거 병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대학병원보다 오히려 더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정밀 검사나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뢰서를 통해 상위 의료기관으로 연계된다.
전문 진료와 입원 치료의 중심, 2차 의료기관
증상이 악화되거나 입원 치료,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의료기관이 역할을 맡는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여러 진료과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맹장염, 골절, 중등도 감염병처럼 비교적 신속한 수술이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선택지다. 대학병원에 비해 대기 기간이 짧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고난도·중증 질환 치료의 최종 단계,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불리는 3차 의료기관은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장비가 요구되는 중증 환자를 주로 담당한다.
이곳은 단순 진료보다 정밀 진단과 고난도 수술,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집중하는 구조다.
의료진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만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진료 공간’이라기보다 중증 치료의 최종 보루에 가깝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분별한 대학병원 선호, 의료 체계 왜곡 우려
현장에서는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는 대학병원 선호 현상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과거 발표한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학병원 방문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판단으로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권용진 단장은 “대학병원은 이미 진단이 이뤄진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경증 환자의 직행이 응급·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형병원 쏠림은 결국 진료 지연과 의료비 증가로 환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의 역할
전문가들은 병원 선택의 기준을 ‘유명세’가 아닌 ‘적합성’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평소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정해두고, 그곳에서 필요 시 상위 의료기관으로 연계받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어느 시점에 어떤 병원이 필요한지 판단해주는 역할은 단골 주치의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무조건 큰 병원을 찾는 습관보다, 의료 체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선택이 결국 개인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