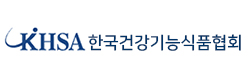조용히 숨어 있다 터지면 3명 중 1명 사망…뇌동맥류 공포
무증상 많지만 파열 시 극심한 두통·구토…손목동맥 시술 등 최신 치료법 발달

도움말: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외과 조현준 교수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환자의 3분의 1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지만 파열되면 극심한 두통·구토가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저하로 이어진다.
가족력 있으면 발병 위험 4배 높아
뇌동맥류의 80~90%는 혈관이 갈라지는 분지부에서 발생한다. 분지부는 혈류 압력이 집중돼 다른 부위보다 혈관벽이 쉽게 약해진다.
크기는 2㎜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며 주로 40~70대에서 발견된다. 발병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고혈압, 흡연, 혈관 손상, 가족력이 주요 위험인자로 꼽힌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다. 다만 크기가 크거나 신경을 압박하면 시야 이상, 시력 저하, 감각저하, 어지럼증,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외과 조현준 교수는 “파열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된다”며 “오심·구토·경부 강직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 마비·의식소실·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의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 절반은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클립결찰술·코일색전술이 대표적 치료법
치료는 크게 두 가지다.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을 집는 ‘클립결찰술’과 혈관을 통해 코일을 넣어 파열을 막는 ‘코일색전술’이다. 환자의 상태, 위치, 크기,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방법을 선택한다.
클립결찰술은 재발률이 낮지만 개두가 필요해 부담이 크다. 코일색전술은 고령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며 회복이 빠르지만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신 시술로 합병증 줄이고 회복은 빨라져
최근에는 기존 한계를 보완한 첨단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특히 뇌혈관 조영술에서 대퇴동맥 대신 요골동맥(손목)을 이용하는 방식이 주목된다.
조 교수는 “요골동맥을 통해 시술하면 대퇴동맥과 비교해 시술시간은 비슷하지만 회복이 훨씬 빠르다”며 “시술 후 곧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혈종 발생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썹이나 관자놀이에 3㎝ 이하 절개만 하는 ‘미니개두술’, 혈류 방향을 바꾸는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 풍선과 스텐트를 동시에 쓰는 고난도 시술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다.
분지형 뇌동맥류에는 금속망 기구 ‘WEB(Woven EndoBridge)’을 넣는 방식도 적용된다. 조 교수는 “WEB은 코일과 스텐트를 함께 쓰는 대신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차단이 가능하다”며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 필요
뇌동맥류는 치료 후에도 재출혈·재발 위험이 있어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다.
조 교수는 “코일색전술이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는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정기적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흡연·음주는 금물이고 고혈압·고지혈증·당뇨·비만 등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조기 발견은 가능하다. 조 교수는 “가족 중 뇌동맥류 환자가 있거나 흡연·고혈압이 있는 고위험군은 건강검진 때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